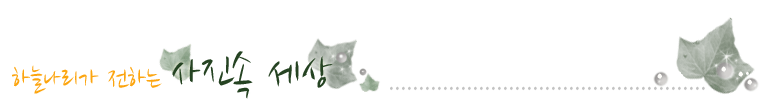내 어릴 적 가을이면 항상 서울에 올라왔다.

부모님께서 일년 동안 농사 지으신 곡식들을
서울에 사는 누나네 집에 가져다 주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은 꼭 서울에 올라 오셨다.
그럴때면 나는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했다.
어느해는 아버지와 어느해는 어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하는 서울 나드리엔 항상 무언가
한가득이 어머니 머리위에 올려졌다.
그리고 여지없이 두손에도 무언가 쥐어졌다.
한손에는 나의 손이 그리고 다른 한손에 갓볶아
짠 찬기름이 들려졌다.
그걸 받고 기뻐할 자식을 생각하면 어머니께서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머리에 올려진 보따리를 풀어 헤칠때 나오는 온갖 물건들을 보며 좋아할 누나의 웃는 얼굴이
어머니의 힘든 어깨를 지탱하여 주었을 것이다.
그때는 서울하면 마장동터미널 한곳 밖에 없었던 걸루 기억한다.
있었다 한들 어린 내가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계속 마장동 터미널에서만 내렸으니깐 그 곳 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서울하면 제일 기억에 나는 것은 복잡한 마장동터미널이다.
어릴적 나는 차멀미가 심해 항상 버스에서 누어서 왔다.
그때는 입석도 있던 시절이라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서서 올라오는 해는 딱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럼 어머니께선 앉아 있는 다른 분에게 부탁에 나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곤 하였다.
토하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 서울에 와 처음 접하게 되는 마장동 터미널....
정신이 없어 별로 기억엔 없지만 차 경적소리와 시끌벅적한 사람 소리는 아직도 생생하다.
시골에서 볼 수 없는 풍경들이었으니깐.
그렇게 많은 차들을 보는 것도 처음이고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
또한 그곳이 처음이니깐 말이다.
설레임과 신기하기만 하던 서울....그리고 서울의 시작 마장동 터미널
지금
나는 서울에서 산다.
어릴적 설레이고 신기하던 서울에서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서울이 싫다.
시끄러운 차 경적소리가 싫다
길 걸을때 지나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싫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싫은 것은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